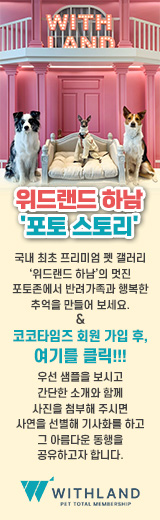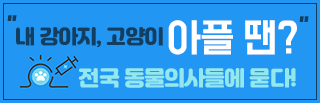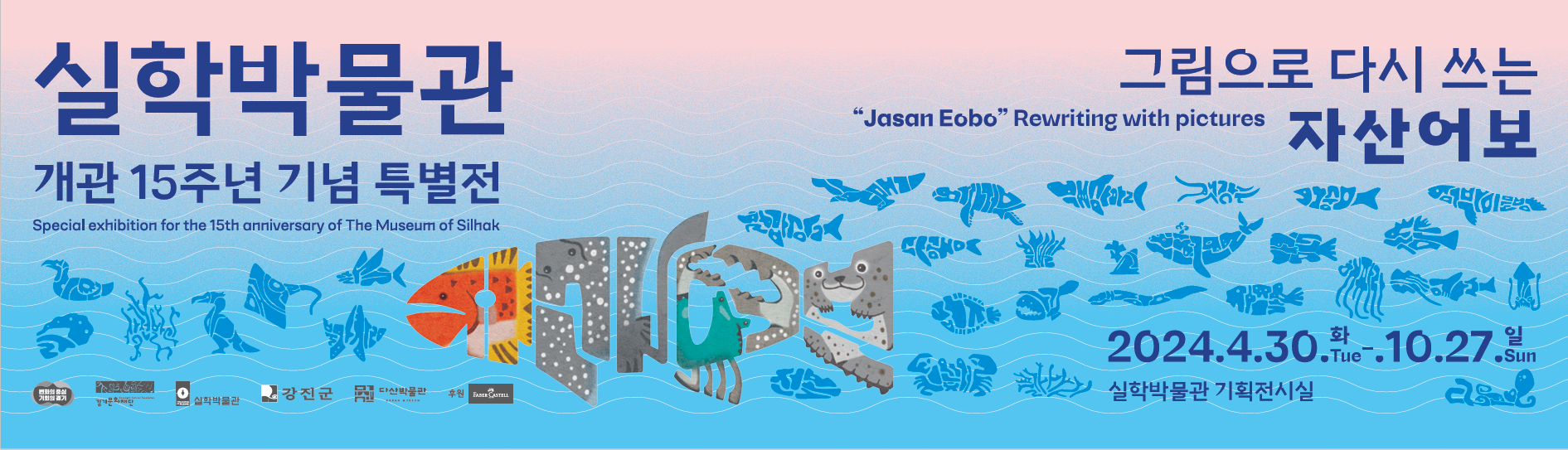【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은 가족인가? 반려인이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 반려인들은 가족(63.3%)보다 반려동물(75.6%)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는 가족보다 가까운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법 사이의 온도차는 크다.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 즉 반려인의 재산으로 취급한다. 최근 배우 구혜선이 함께 기르던 반려동물의 거취 문제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개는 결혼 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혼 분쟁 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가 자녀 양육권 다툼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한다. 법원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도 누가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평소 누가 산책을 더 많이 시켰는지, 밥을 누가 많이 줬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생명체를 인간 혹은 물건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민법과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은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독일은 2002년 기본법을 개정해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권'(animal rights)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 헌법은 국가의 보호 범위를 ‘자연적 생활기반 및 동물’로 규정한다. 스위스 헌법 역시 자연환경 및 생명보호를 선언하고 동물 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동물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의 보호 대상에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로서 동물 보호는 법적 의무가 아닌 인도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동물 복지 혹은 보호에 관한 법 제도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곧 발표할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년~2024년)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